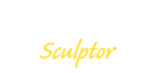About the artist
작가노트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많은 기억과 사건 속에서 갈등하고 동요한다.
그 순간의 갈등과 망설임들은 기억의 파편이 되어 오랜 시간 나의 삶과 함께하며 나의 인생을 만들어 주고 지금의 나의 모습을 만들어 주었다.
순간의 아픔, 즐거움, 쾌락, 눈물로 아파하던 그 순간, 순간의 기억과 잔상들은 지나간 시간이 되어 버렸지만 지금 이 순간도 나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되어 다가오곤 한다.
‘moment' 작품 연작들은 종이를 찢고, 선물을 포장하고 있는 종이를 찢어 벗기는 과정에서 발상이 시작 되었다. 찢어 벗기고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 하는 바램의 순간들 그리고, 종이를 찢고 사진을 찢음으로 지나간 시간을 잊고 버리려는 결단의 순간들, 그 순간들은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닌 찢어냄으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moment' 연작의 얼굴 이미지들은 기억의 파편들이며 A4용지에 긁적인 낙서일수도 프린트했던 사진 이미지일 수도 있다. 찢겨지고, 구겨지고, 버려지는 종이처럼 우리는 기억되어지는 것과 잊혀지고 버려지는 것들의 사이에서 언제나 망설이고 있다.
찢는 순간, 우리는 지나간 것들을 잊으며 새로운 시작과 다음 시간을 기대한다.
-김원용

김 원 용 / 金 源 矓 / Kim Won-yong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졸업
논문/ “한국 장승의 조형적 특징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미술학과(조각전공) 졸업
▣ 개인전
2023.08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 '호기심의 방' 김원용 기획전 “채집된 기억”
2012.09 갤러리 아리오소 초대개인전“MEMORY" ,울산
2012.05 저작걸이전”문학과 예술의 만남”초대전,한가람미술관,서울 2010,09 갤러리 SO 초대전 (Gallery SO),서울
2010,05 Moment전(인사아트센터),서울
2002,07 김원용 야외 조각 초대전,세종문화예술회관 야외 전시장
▣ 아트페어
2023 아트페어 대구 2023, 대구
2022 아트페어 대구 2022, 대구
2022 부산국제 아트페어(BAMA), 부산
2018 Artrooms Seoul 페어. 서울
2017 상해 아트페어 중국,상하이
2016 CONTEXT NEW YORK 미국 ,뉴욕
2016 ART WYNWOOD 미국
2016 SCOPE NEW YORK 미국
2015 SCOPE ART MIAMI 미국
2015 Battersea Affordable Art Fair,영국, 런던
2015 Seoul Affordable Art Fair, 서울, DDP알림1,2관
2014 Selection Art Basel, Swizerland Basel(Leonhard Ruethmueller) 2013 Art Ulm, Ulm 독일
2012 Art Edition, COEX,서울
2012 Selection Art Basel, Swizerland Basel
2011 Art by Geneve,Palexpo, 스위스 제네바
2011 Art Karlsruhe, 독일 칼스루에
2011 KIAF , 서울 COEX
2010 Art Miami (Leonhard Ruethmueller), 미국 마이애미
▣ 공공미술 프로젝트
2009 재래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조동모서” , 화성 사강시장
▣ 주요그룹, 초대전
2022
광장조각회전 / 금보성아트센터, 서울
2018
Art Korea London2018 , Ledam Art gallery ,영국,런던
2017
엠블호텔 전시,고양조각가협회,일산
현대작가초대전, 양산, 스페이스 나무 갤러리
Art Korea London2017, Ledam Art gallery, 영국, 런던
2016
확장의 흔적전, 이정아갤러리, 서울
광장조각회 정기전, 관훈갤러리, 서울
2015
“WHO ARE YOU” FACE 전, 천안예술의전당 미술관 기획전, 천안 광장조각회 정기전, 한전 아트센터, 서울
2014
GS칼텍스 예울마루 개관2주년 기념전“사람과 사람들전” 조각그룹 광장전,경희궁 미술관
2012
“A magic moment” 스위스 바젤, Swizerland Art center Hall33 여수 국제 아트 페스티벌 ,여수
2011
양평군립미술관 개관전(양평 군립미술관)
Korean Collective Basel2011,
(Leonhard Ruethmueller Contemporary Art),스위스 바젤
전북 미술의 오늘 (전북 도립 미술관 서울관), 인사아트센터 , 서울 GOOD TIME전 (구로아트벨리),서울
2010
송도 조각 페스티벌(송도 커넬워크), 인천
고양 야외조각축제(일산 호수공원)
(주)디자인 반디 김원용 조각가 경력사항(1) i
부산비엔날레 특별전 한.중.일 극사실 조각전(부산시청 전시실),부산 가평야외조각 심포지움 조각초대전(가평 이화원),경기
2009
성남 야외조각 축제, 경기도 성남
전국 야외조각 초대전(울산 문화예술회관),울산
디지털 문화와 현대 조각전(SAT갤러리),서울
2008
아산 국제조각 심포지움 야외 조각초대전, 아산
부천 현대조각 협회초대전“놀이 덤블 속으로”(부천시청),경기 2005
조각그룹광장전(세종문화예술회관),서울
2004
대한민국 청년미술제 한국미술의 소통전(단원미술관),안산 전주대학교 교수작품전(전주대 미술관),전주
경기북부 지역작가초대전(경기도 제2청사),의정부 도시환경과 조형의 탐색 전(백송화랑),서울
2003
고양현대미술제 청년작가 초대전(고양 꽃 전시관),일산 고양 야외 조각 축제 - Street Furniture전(미관광장),일산 전국조각가 협회전(소리문화의 전당),전주
2002
유연한 움직임 - 숨전(홍익대학교 미술관),서울
한국미술 - 50인 작가 초대전(청원문화예술관),일산
고양 야외 조각 축제 - Street Furniture전 (일산)
미술세계 대상전-입선- (세종문화예술회관),서울 고양미협전(고양 세계 꽃 박랍회장),일산
2001
전국조각가 협회전(광주시립미술관)
2000
전국조각가 협회전, 공평아트센터(서울)
용두국제 환경미술제,금화랑(부산)
조각의 언어로 표현한 자연 전, 목암미술관(경기도) 외다수그룹, 초대전 참여
▣ 작품소장
단원 조각공원, 안산
sh공사 서울 동남권유통단지 상징조형물(가든 파이브),서울 울산 중구청 로비, 울산 중구
울산 중구 문화예술의전당, 울산 중구
현대중공업 인재교육원. 울산 남구
도시공사 청량율리 보금자리주택 미술작품, 울산
Atlas Partners, LLC ,시카고
창원 상남동 메종드테라스 미술작품, 경남 창원
양산교동 월드메르디앙 에뜨젠 1단지, 경남 양산 세영이노7 지식산업센터, 울산
양산 평산동 KCC스위첸
화성 그린시티 세영 에듀파크
국회 스마트워크 프레스센터 미술작품
덕산 하이메탈 신축사옥 작품 설치
한탄강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조형물 설치
울산중앙병원 미술작품
시흥 아쿠아 펫랜드 미술작품
▣ 수상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미술세계 대상전 특선 미술세계 대상전 입선 전라북도 미술대전 특선 전라북도 미술대전 입선 전국 춘향미술대전 특선
▣ 현재
한국미술협회 조각분과 기획이사. 고양조각가협회. 조각그룹 광장회원. 전국조각가협회
(주)디자인 반디 대표.
▣ 기타경력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2021)
전주대학교 미술학과 강사 역임(2004~2006)
ARTROOMS SEOUL 운영본부장(2018)
기억 속에서 나를 만나다
고충환(Kho, Chung-Hwan 미술평론)
그 혹은 그녀로부터 절교를 선언하는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는 비록 한 장의 종이에 지나지가 않지만, 그래서 가볍지만, 정작 그 종이에 담긴 내용만큼은 무겁고 아프다. 그래서 나는 가벼우면서도 무거운, 그 기묘한 편지를, 그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인 편지를 구겨서 버린다. 그러나 그 편지는 결코 버려지지가 않는다. 종이는 버릴 수가 있지만, 편지는 버릴 수가 없다. 마음으로 쓴 글이며, 마음이 탑재된 글이며, 마음은 버려지지가 않기 때문이다. 육화된 글은 몸의 일부로 새겨진(상처?) 탓에 결코 지워지지가 않는 법이다.
때론 실제로 나에게 일어난 일일까, 싶을 만큼 까마득한 일이지만, 그 사건은 기억의 회로를 타고 흘러 현재의 나에게로까지 전송된다. 그것도 어느 날 문득,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때론 어렴풋하게, 어렴풋하면서 생생하게 재생된다. 나는 매순간 과거 속으로 밀어 넣어지는데, 그래서 과거의 나는 이미 없는데, 그 부재하는 내가 현재하는 나에게로 호출된 것. 엄밀하게는 내가 호출했다기보다는, 저절로 떠오른 것. 내가 그와 나로 분열되고 있다는 사실, 그렇게 분열된 그가 나와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존재하면서 동시에 부재하다는 사실, 내 속에 그가 여실히 살고 있음을 떠오른 그는 주지시킨다.
그 혹은 그녀가 혹 나에게 뭔가를 선물했을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이처럼 가정법으로 말하는 것은 지금 다른 선물 포장지를 뜯으면서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며(연상 작용?), 모르긴 해도 꽤나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그 혹은 그녀와의 관계를 생각해볼 때 한번쯤 있을 법한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로 분열된다는 사실, 나에게 일어난(일어났을 수도 있는) 일을 가정법으로 말해야 한다는 사실이 일견 친근하면서도 낯설다. 없는 나에 대해, 부재하는 그에 대해 말하는 경험은 언제나 생경하면서도 부조리하다. 기억은 이처럼 선물 포장지를 뜯을 때 나는 소리와 함께, 그 알록달록한 혹은 세련된 포장지의 문양과 함께, 그 포장지 속에 어떤 애틋한 마음씨가 들어 있을까, 하는 두근거림과 함께 어김없이 그를 되불러온다. 나는 그와 대면하지 않고선 결코 선물 포장지를 뜯을 수가 없다.
그리고 몇 장인가의 색도 바래고, 빛도 바랜 사진들. 모르긴 해도 그 사진 속 그 혹은 그녀의 형체 또한 머잖아 바래 질 것이다. 바래진다는 것, 지워지고 흐릿해진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는 사라져버려 까마득해진다는 것은 사진의 운명이다. 사진 속 피사체가 아름다운 것은 바로 그 없어진다는 것의 아우라 때문이며, 그럼에도 그 속에 지워진 것들을 낱낱이 품고 있는 흔적의 고집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고집 그대로 기억의 생리를 닮아있다. 사진은 마치 기억의 집과도 같다. 사진을 찍을 때 피사체는 또렷하지만, 점차 그 피사체는 희미해져 간다. 그래서 사진은 시간의 집이기도 하다. 사진이 희미해지면 기억도 덩달아 희미해진다. 한참 시간이 흐른 이후에 그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면 그렇게 희미해진 시간만큼의 흔적을 되돌려준다. 바래지는 것, 희미해지는 것, 소멸되는 것은 아름답다. 아름다움은 사실 자체로서보다는 그 사실이 흔적으로 남아, 그 흔적이 불러일으키는 애틋함, 애잔함, 애절한 마음과 더불어서 온다. 부재와 흔적이 사진의(그리고 존재의) 아름다움이며 아우라다. 그 희미해진 흔적의 잔영들 속에서 나는 한때 아름다웠을 그를 본다.
그리고 청춘의 낙서. 청춘일 때 청춘이 하는 낙서는 대개 여리고, 무절제하고, 무분별하고, 치기어리고, 이상적이고, 순결하다. 그 속에 현실원칙이 간여될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때로 현실원칙은, 현실에 대한 부닥침은 오히려 그 이상주의를 더 강화시켜주고, 그 순결함을 더 무모하게 해줄 따름이다. 청춘의 낙서는 이처럼 현실원칙에 오염돼 있지 않기에, 현실원칙이 오히려 청춘을 더 강화시켜주기에, 나아가 현실원칙에 탑재된, 청춘에 위배되는 억압의 계기를 폭로하기에 그만큼 더 순결하다.
Moment 연작은 종이를 찢고, 선물 포장지를 찢는 과정에서 그 발상이 시작되었다...moment 연작에 나타난 얼굴 이미지들은 기억의 파편들이며, 종이에 긁적인 낙서일 수도 프린트한 사진 이미지일 수도 있다. (그렇게) 찢겨지고, 구겨지고, 버려지는 종이처럼 우리는 기억되는 것과 잊히고 버려지는 것들(망각되는 것들?) 사이에서 언제나 망설이고 있다고, 작가는 작가노트에 적고 있다.
이상의 글은 이러한 작가노트에 기초해서, 김원용의 작업에서 느껴지는 인상을 좀 더 서사적인 표현으로 재구성해본 것이다. 대략 눈치 챘겠지만, 그 경험은 작가의 개인사적인 경험의 경계를 넘어 보편성을 획득한다.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의 경험일 수가 있는 것. 그러면서도 엄밀하게 말해 작가는 개인사적인 경험을 다루고 있다고 선뜻 말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일을 기억해낸다기보다는(기억의 특정성), 기억 자체의 생리와 속성을(기억의 보편성) 주제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하튼 그 저변에는 어떤 식으로든 작가의 경험이 스며들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식의 작업이 나와질 수가 없는 것. 작가의 작업은 말하자면 단순한 형식논리(이를테면 찢겨지거나 구겨진 종이 그대로를 입체로 옮겨본)의 산물만은 아니라는 말이다.
여하튼 가벼우면서 무거운 편지, 애틋함으로 마음을 설레게 하는 선물 포장지, 기억처럼 희미해진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치기와 치열함으로 비장감마저 감도는 청춘의 낙서들(그 낙서들이 현실원칙과 부닥치는 것을 보는 것은 장엄하다)은 하나같이 종이며 평면들이다. 그렇다면 이 종이며 평면들을 회화도 아니고, 어떻게 조각으로, 입체로 옮길 수가 있을 것인가. 평면 오브제를 평면으로 옮긴 회화는 더러 혹은 꽤나 알려져 있지만, 작가의 경우에서처럼 평면 오브제를 입체로 옮긴 예는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다(전무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작가의 작업은 어느 정도 자신의 개성적 언어가 기생할 수 있는 숙주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여하튼, 평면의 무엇을 어떻게 입체로 불러낼 수가 있을 것인가. 여기서 편지, 포장지, 사진, 낙서 등 형식요소가 아니라, 그 형식요소를 수식하고 있는 성질들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가벼우면서 무거운 마음, 애틋한 마음, 희미해진 기억, 그리고 치기와 치열함으로 무장된 순결한 마음 등 그 형식요소에 탑재된 것들이며 의미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그 의미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이러저러한 마음 혹은 기억의 편린들)을 머리에 떠올리고, 이미지화하고, 이를 재차 입체로 형상화하는 것이다. 결국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화하는 것.
그렇게 형상화된 것이 얼굴들이다. 작가의 작업에 나타난 일련의 얼굴들은 말하자면 프린트된 사진 이미지를 입체로 옮긴 것일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기억의 표상들이며, 엄밀하게는 어떤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의 표정들을 포착한 것이다. 이를테면 한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거나 양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고 있는 표정이 참담하거나 잊고 싶은 기억을 표상하고, 결의에 찬 눈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표정의 얼굴이 어떤 결단의 순간을 예고하는 기억을 표상하고, 구김이 심해 눈에 띠게 훼손된 얼굴이 자기연민에 사로잡히는 순간의 기억을 표상한다. 이 일련의 표상들에는 일종의 표정의 유형학으로 정리될 만한 부분이 있다(이를테면 슬픈 표정, 결의에 찬 표정, 암울한 표정 같은).
기억은 묘한 부분이 있다. 잊고 싶은 기억은 집요하고, 음미하고 싶은 기억은 쉽게 잊힌다. 기억하기 싫은 기억은 고집스럽게 되돌아오고, 기억하고 싶은 기억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지워진다. 아마도 인간은 상처를 내재화하고, 그 상처를 상처의식(그 자체 결여의식과도 통하는)으로까지 발전시키는, 그리고 그 상처의식을 자양분 삼아 사유로까지 진작시키는 자기반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이 아닐까(물론 개인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고서야 기억의 이렇듯 고약한 생리 내지는 현상을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듯 기억의 순간들을 표상하는 얼굴들이 찢겨지거나 구겨진 종이 위에 탑재돼 있다. 편지를 구겨서 버리는, 그래서 구겨진 종이를 볼 때마다 문득문득 되살아나는 기억의 순간을 표상하고, 선물 포장지를 뜯거나 사진을 찢을 때 떠오른 기억의 순간들을 표상한다. 작가의 작업 중엔 얼굴 외에 장미를 소재로 한 것이 있는데, 아마도 선물 포장지를 뜯을 때 떠오른 기억을, 그 가슴 설레는 순간을 표상할 것이다. 이에 반해 사진을 찢게 만드는 기억은 분명 좋은 기억일 리가 없다.
여하튼, 그렇다면, 낙서는, 특히 청춘의 낙서는(청춘의 낙서는 더 낙서답고, 그런 연유로 모든 낙서는 어느 정도 그 속에 청춘에 대한 기억이나 흔적을 내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청춘의 낙서는 무모함과 무분별함으로 흔히 현실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현실원칙에 부닥치는 청춘의 낙서는 이상주의의 좌절과 쓸쓸한 패배로 나타난다. 마구 구겨진 날개 혹은 찢어진(차라리 부러진 것처럼 보이는) 날개가 이렇듯 좌절된 이상(혹은 이상주의)을 표상한다. 모든 무모한 것들, 순결한 것들, 패배하는 것들은 날개가 있다. 높은 곳(이상 혹은 이상주의)에서 추락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추락한 것들은 여전히, 오히려 더 아름답다. 어쩌면 아름다움은 날개(이상 혹은 이상주의) 자체가 아니라, 그 날개가 추락할 때(현실원칙과 이상주의가 부닥칠 때, 그래서 예고된 추락을 온몸으로 실현할 때)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김원용의 작업은 찢겨지거나 마구 구겨진 종이 형상(그 자체가 상처 입은 마음의 메타포 같은) 위에 기억의 편린들을 이식해놓은 것이란 점에서, 더욱이 그 정황을 입체로 구현한 것이란 점에서, 그리고 그것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는 점에서 형식적으로 남다른 지점을 획득(혹은 선점?)해놓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내용 면에서 기억이 작가의 전유물일 수도 없고, 더욱이 이미 여러 경로로 기억의 형상화가 꽤나 성공적으로 실현된 경우들을 볼 수가 있다. 하지만 기억을 형상으로 옮기는 작가 나름의(어쩌면 독특한) 방법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엿보이고 있고, 그 방법은 날로 섬세함과 밀도감을 더해가고 있다.
원래 기억은 희미한 법이다. 그리고 그 희미함으로, 혹은 희미해서 오히려 더 그것이 품는 아우라의 용량은 크다. 작가는 기억의 섬세한 결을 헤집어 때론 슬프고, 때론 아프고, 때론 가슴 설레고, 때론 무모함으로 순수했던 저마다의 기억 속으로 호출하고, 그 기억 속에서 오랫동안 잊혔던 또 다른 자기와 조우하게 한다.